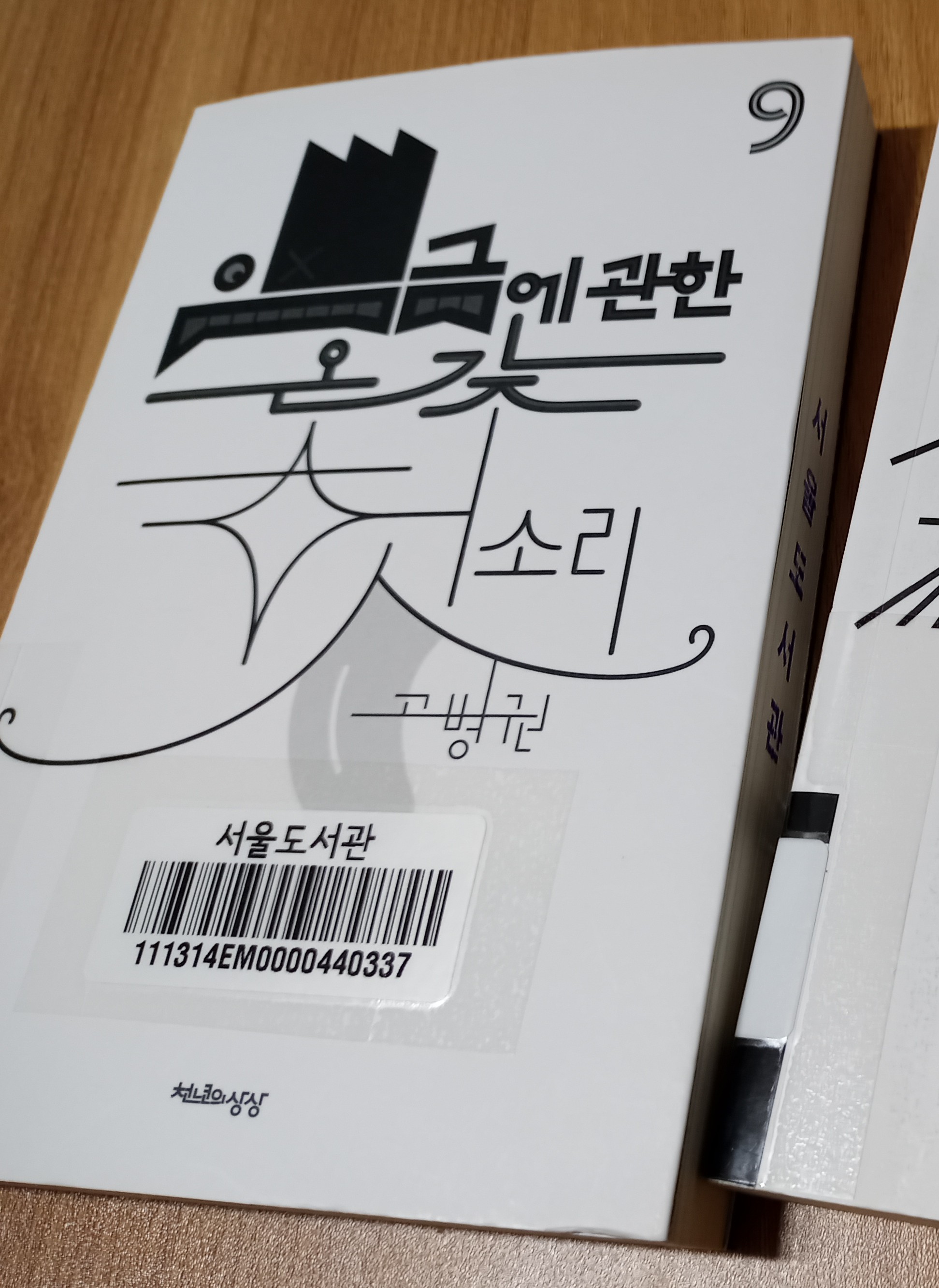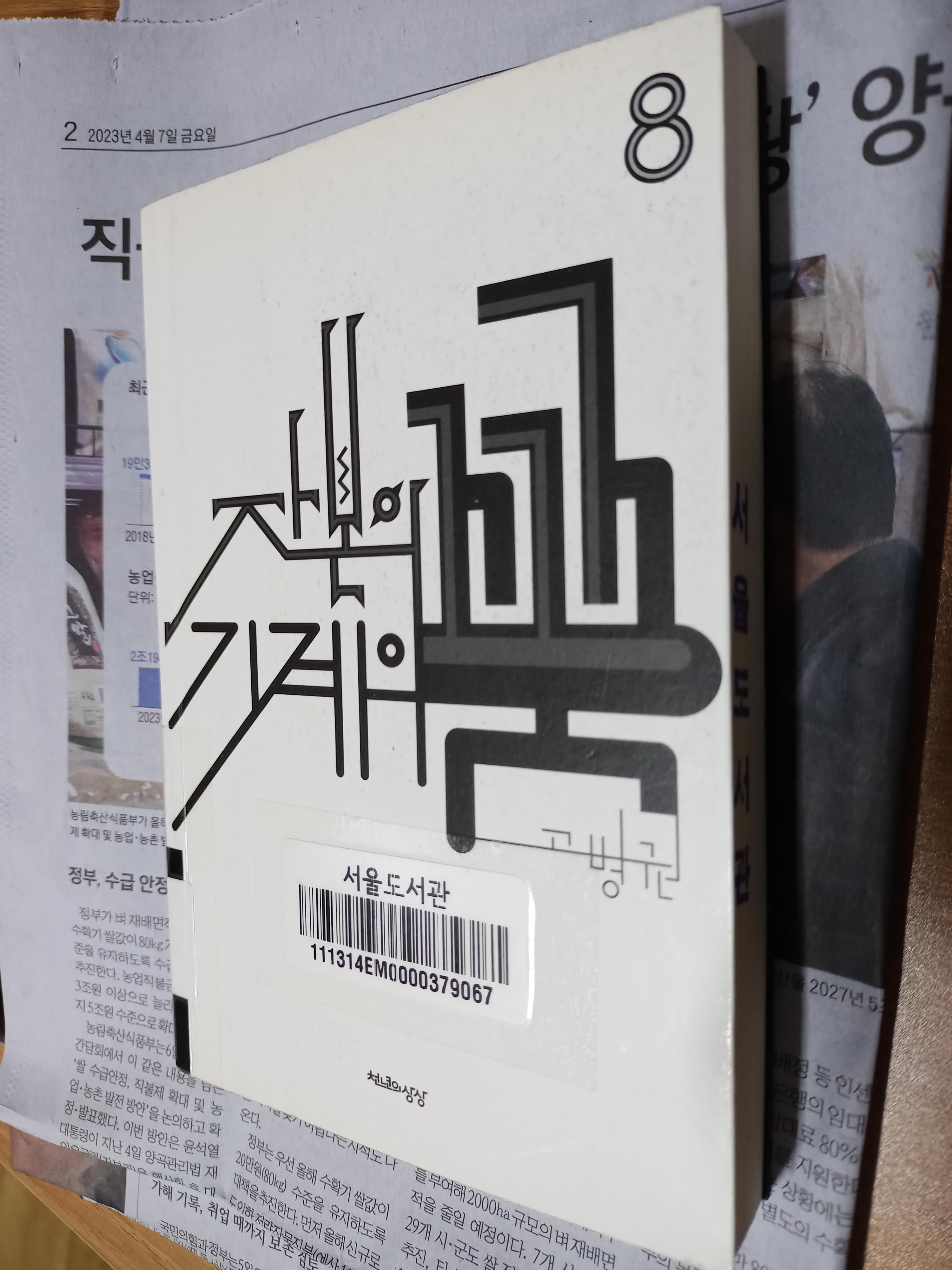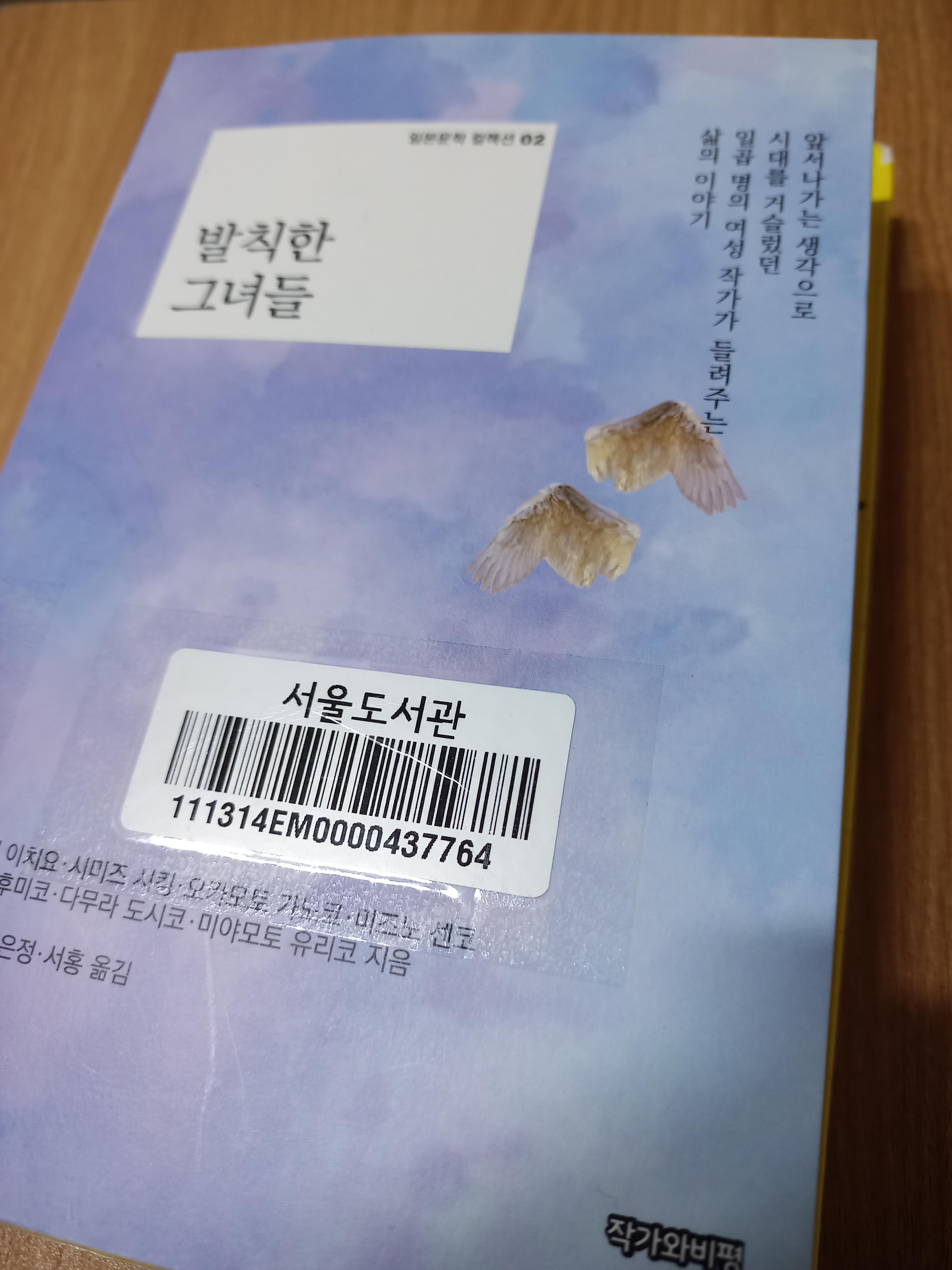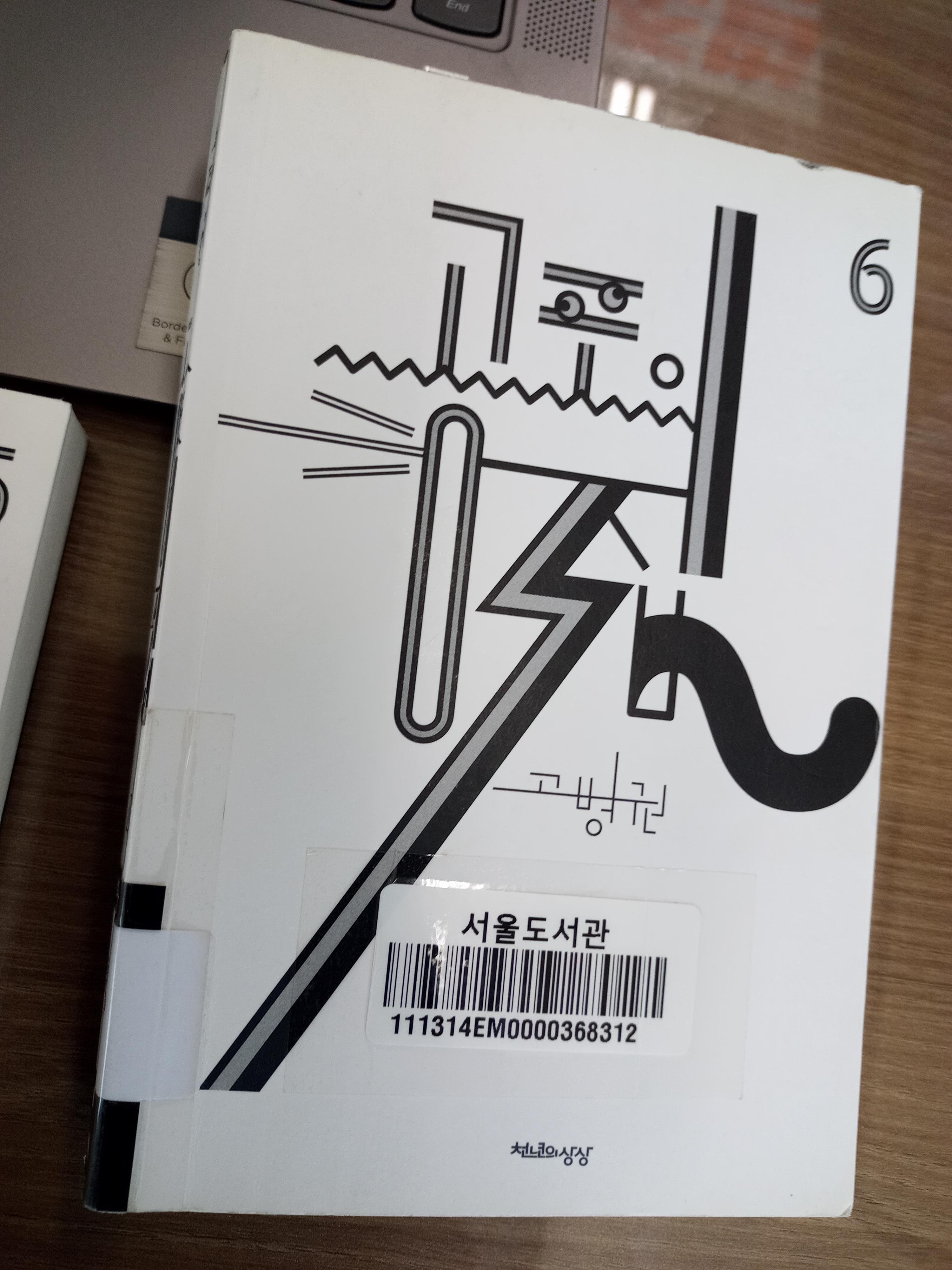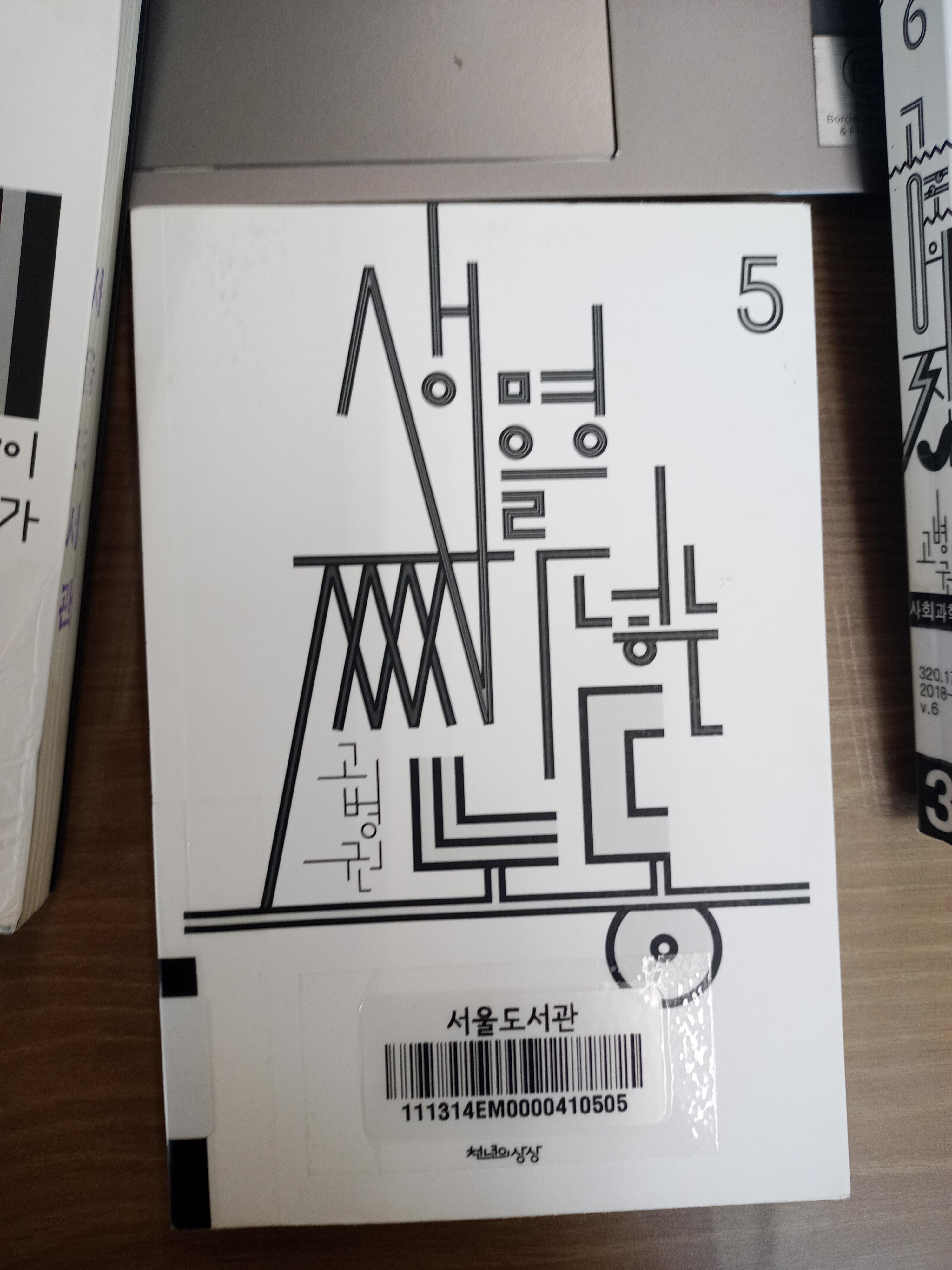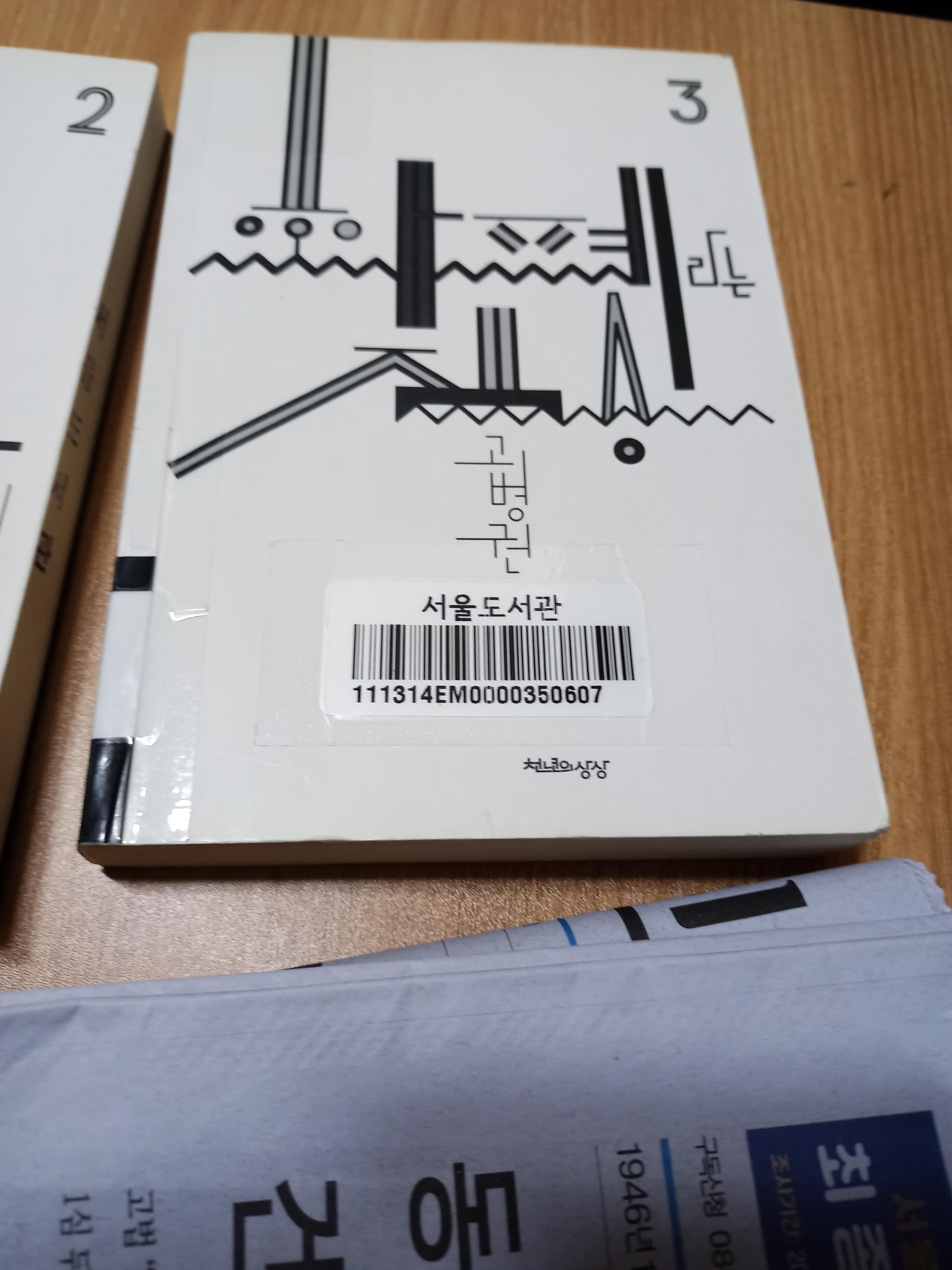고병권 지음. 천년의상상 펴냄. 2020년 3월 30일 초판 1쇄. 2021년 6월 7일 초판 2쇄. 자기 시대로부터 거리를 둘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시대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다른 시대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19쪽). “작가가 생산적 노동자인 것은 그가 사상을 생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작품을 출판하는 출판업자를 부유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어떤 자본가의 임금 노동자인 한에서 생산적이다.”·····중략·····마르크스가 정작 보이고 싶어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생산적 노동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이상한가'입니다. 아이들의 능력을 키우는 교육자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교육자가 생산적 교육자이고, 좋은 생각을 펼치는 작가가 아니라 많이 팔리는 책을 쓰는 작가가 생산적 작가라니, 이 얼마..